정신분석 리뷰
김연수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크레도
2018-04-23
2018-04-23 15:29:16

꿈을 꾼다. 사람이 살지 않는 차가운 벌판에 15세 쯤된 교복 입은 여학생이 말없이 홀로 서서 나를 노려본다. 자세히 보니 얼굴에 눈코입이 없다. 깜짝 놀라 다시 들여다봐도 역시나 눈코입이 안 보인다. 무섭고 싸늘하다. 여학생은 어디서 왔을까? 눈도 없는데 왜 무섭게 노려보는 느낌일까? 입도 없는데 왜 말 없다고 느껴질까? 몇 년 전 기억 하나가 확 다가온다. 김연수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읽은 후 얼얼한 기분으로 주인공을 상상하며 눈코입 없는 얼굴을 그렸던 것 같다. 오래묵은 스케치북을 뒤져 그때 그린 그림을 발견한다. 짧은머리를 긴머리로 바꾸면 꿈에 나온 여학생과 거의 비슷하다. 살짝 소름이 돋는다. 프로이트가 말한 언캐니한 경험이란 게 이런 걸까.
꿈 속 여학생을 만나는 첫 길에서 일단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쫒아가 보기로 한다. 소설의 어떤 장면에서 그런 이미지가 자극됐는지 기억을 되살리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읽은지 오래여서 줄거리도 가물거리고 생각나는 게 거의 없다. 우연히 유투브에서 소설 낭독해주는 오디오북 채널을 발견한다. 낭독 목록에 이 소설이 있다. 기분 좋은 우연이다. 전철을 오가면서 다시 듣는다. 소설을 듣는다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은 미국으로 입양된 20대 여성 카밀라가 친엄마를 찾아 한국에 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엄마 고향 진남에 들러 엄마의 자취를 수소문하던 끝에, 여고생이던 엄마가 아빠 없는 아이를 임신하고, 사람들의 입소문과 압박 때문에 아이를 낳고 입양시킨 이야기를 전해듣는다. 그 후 카밀라의 엄마는 진남 앞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엄마를 만나러 왔다가 만난 삶의 진실은 잔인하다. 엄마가 남긴 사진 한 장을 들고 ‘엄마는 내게 어떤 존재이며, 나는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지’ 추적하는 카밀라의 여행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이자 자기를 만나는 과정이다. 카밀라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엄마처럼 바다에 몸을 던지기도 하며, 엄마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엄마가 임신했을 때 고향에서 벌어진 파업사건도 들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세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낀다.
작가 김연수의 문체는 섬세하고 함축적이며 느릿느릿하다. ‘미지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가는 느낌을 이미지와 촉감과 색감으로 연상하게 만드는 詩와 같은, 바다와 같은, 물기 많은 언어다. 그래서인지 소설을 낭독하는 성우의 목소리에는 왠지 바닷물에 적신 축축함과 부드러운 슬픔이 묻어 있다. 눈으로 전해지는 언어와 귀로 전달되는 언어가 이토록 다르다니. 눈의 감각과 귀의 감각이 남기는 질량과 부피와 양감이 이토록 차이가 나다니. 같은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다시 듣는 동안 예전과 다르게 자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두 감각의 다름이 빚어내는 미세한 차이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귀로 전달되는 이야기와 눈으로 활자를 읽으면서 만나는 이야기는 아주 다른 느낌이다. 오디오는 텍스트보다 더 생생하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라서 순식간에 깊이 빠져 들게 되고, 단어 한마디 문장 하나에도 마음이 덥혀져 울컥 눈물이 난다.
전철 안에서 소설을 듣고 있는 현실의 나와, 소설 속에서 또다른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카밀라가 섞여, 마치 나와 카밀라가 함께 눈코입 없는 낯선 엄마를 찾아가고 있는 오묘한 느낌을 받는다.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듣는 동안 몸과 마음에서 겪은 낯설고 이상한 그 경험은, 어쩌면 카밀라가 겪은 느낌이자 꿈에 나타난 눈코입 없는 여학생이 겪은 느낌일 것이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눈코입 없는 여학생 얼굴을 그린 이유를 알 것 같다. 그 여학생이 꿈에 나타난 이유를 알 것 같다. 윤곽만 있고 실체가 없는 카밀라의 엄마, 죽어서 바다 밑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대상, 하지만 늘 마음 속에 존재하며 다시 재회하고픈 원초적 이데아 같은 무엇. 그것을 표현하느라 그렸겠지. 여전히 그것을 찾고 있어서 그랬겠지.
눈코입 없는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춥고 황량한 벌판을 헤맨다. 여학생이 떠나온 땅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온다. 자기 발로 그곳을 떠나왔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들에게 등 떠밀려 쫓겨났다는 억울함이 남는다. 소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주춤거리다가, 상대를 믿기 어려워 머뭇거리다가, 관계는 끊어지곤 한다. 소통할 방법이 없다고 느낀다. 혼자 추운 벌판을 떠돌다 사라지는 것이 눈코입 없는 여학생의 운명일까.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무조건 다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이상적인 엄마는 없다. 이상적인 엄마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원한다. 떠나온 그곳에는 온통 불만족한 엄마들로 가득하니까. 황량한 벌판에는 이상적 엄마는커녕 불만족한 엄마조차 찾아볼 수 없다. 살아 숨쉬는 생명이라곤 벌판을 휘몰아치는 차갑고 냉랭한 겨울바람뿐 외통수에 갇힌 것이다. 이유를 모른 채 슬프다. 말을 한들 소통할 수가 없다. 들려오는 말도 낯설다. 바라보아도 만날 수가 없다.
카밀라는 익숙한 곳을 떠나와 낯선 곳에서 헤매이며, 세상이 투명한 막에 쌓인 채 자신의 살과 접촉하지 못한 까닭을 더듬더듬 찾아간다. 진실은 울퉁불퉁하고 짠하고 통증을 유발하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덕분에 카밀라는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불만족한 엄마들로 가득한 곳에서 연민하고 애도하면서 외통수를 벗어난다. 이상적인 엄마가 없어도 억울하지 않은 마음이 된다. 엄마를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할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 또한 조금씩 뚜렷해지고 회복되는 카밀라는, 자기 것이 아니라 믿었던 조각들을 하나씩 통합해 나가는 self 혹은 ego의 여정과 닮았다. 카밀라를 따라가면 눈코입 없는 여학생 또한 차고 황량한 벌판을 벗어나 증오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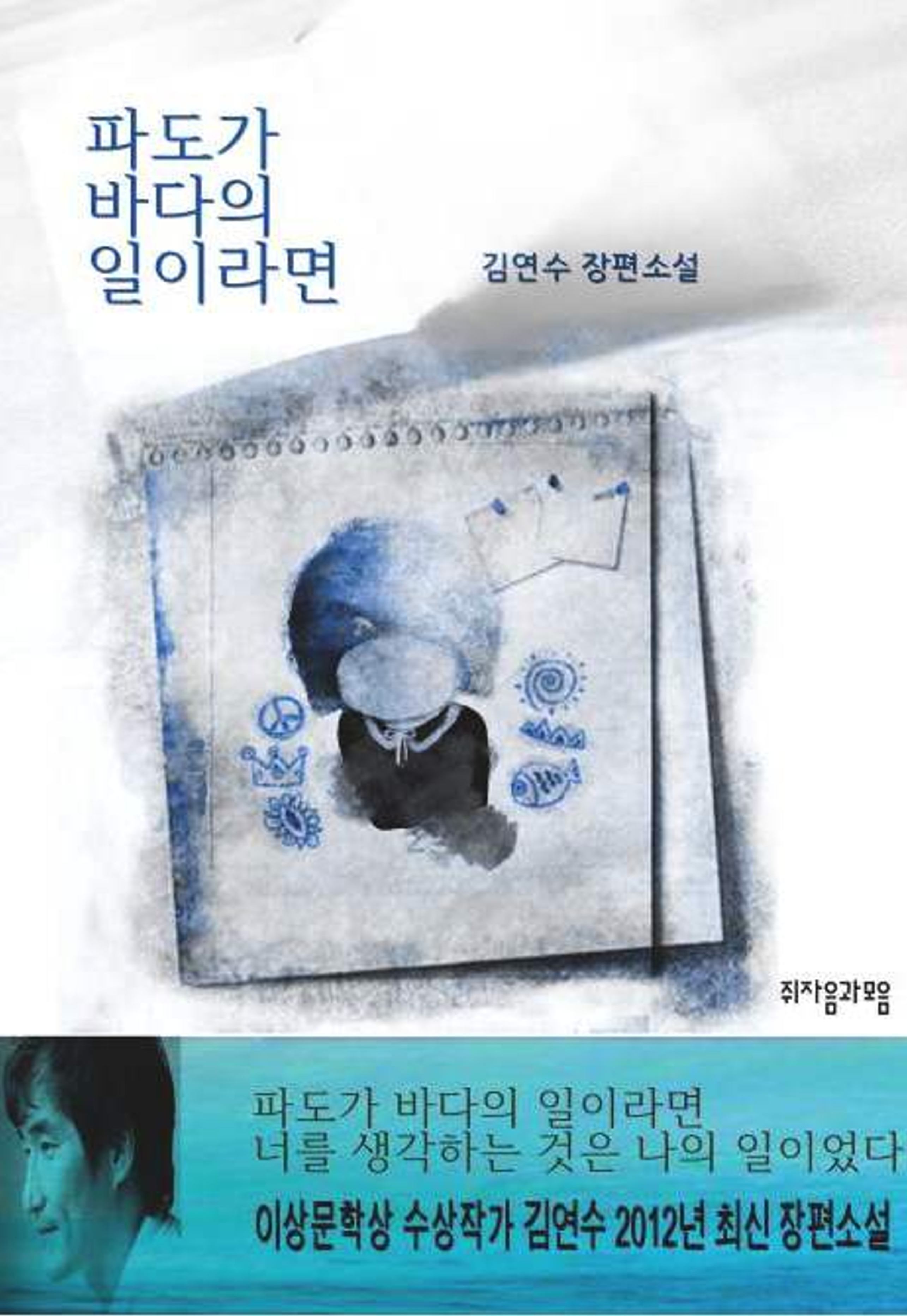
2.
작가 김연수는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깊고 어둡고 서늘한 심연이 존재한다. 심연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다.' 나를 혼잣말하게 하는 고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 심연이다. 심연에서, 거기서, 건너가지 못한 채, 그럼에도 뭔가 말할 때, 가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연 저편의 당신을 향해 말을 걸 때, 그때 내 소설이 시작됐다. 나의 말들은 심연 속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다시 써야만 한다. 깊고 어두운 심연이, 심연으로 떨어진 무수한 나의 말들이 나를 소설가로 만든다. 심연이야말로 나의 숨은 힘이다. 가끔,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나의 말들이 심연을 건너 당신에게 가닿는 경우가 있다. 소설가는 그런 식으로 신비를 체험한다.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비를 체험한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어둠 속에서 포옹할 때, 두 개의 빛이 만나 하나의 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듯이.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심연을 건너가는 것, 우리가 두 손을 맞잡거나 포옹하는 것, 혹은 당신이 내 소설을 읽는 것, 심연 속으로 떨어진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부디 내가 이 소설에서 쓰지 않은 이야기를 당신이 읽을 수 있기를.“
김연수는 또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심연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타인의 본심에 가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날개를 가질 수 없으며, 날개는 꿈과 같은 거라고 본다. 타인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그것 또한 꿈과 같은 일이라서,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알 방법은 없다고. 그럼 날개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날개는 우리가 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날개가 없었다면, 난다는 생각도, 날 수 없다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의 희망은 심연을 건너가는 날개에 있다는 역설을 설파한다. 날개는 없지만 날개를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애써보는 역설. 카밀라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심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엄마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 물밑에 가려져 있던 새로운 존재와 대면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작가가 소설을 통해 사람 사이에 놓인 심연을 건너보려 몸부림치면서 역설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다.
정신분석 또한 사람 사이의 심연을 통과해 타인의 마음에 가닿기 위한, 타인의 마음과 만나기 위한 신비한 날개와 같다. 인간은 날 수 없지만 정신분석이라는 도구는 ‘가끔 아주 가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심연을 건너는 날개가 될 때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작가는 소설 속의 말들이 무수히 심연으로 떨어져 타인에게 가닿지 못한 채 사물이 되어버려도 언젠가 끝끝내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헛된 것처럼 보이는 소설이라는 날개짓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소설 쓰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작가의 태도는 정말이지 눈물겹다.
심연 속에서 죽어가는 말들에, 눈코입 없는 여학생이 뿜어내는 심연의 언어에 귀 기울여 들어볼 노력. 그게 바로 정신분석적 태도이다. 눈 앞에서 오고가는 것만이, 직설적이고 솔직한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너와 나 사이 심연 속으로 추락하는 죽은 말들을 소통이라 믿어선 안된다. 서로에게 가닿지 못한 채 숱하게 심연으로 떨어져버린, 날개가 부러져 추락한 언어들은 어디로 갈까. 얼마나 많은 진실의 언어들이 심연으로 사라질까. 카밀라가 엄마를 만난 건 엄마와 카밀라 사이에 놓인 심연을 잠깐이나마 건너가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눈코입 없는 여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신비체험’을 하려면, 나와 여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검은 심연을 건널 수 있는 날개를 자꾸자꾸 만들어내야 한다. 코헛이 말한대로 나르시스틱하고 교조적인 태도를 벗고 충분하게 소통할 때 타인 또한 자신만의 교조적인 태도를 벗고 너와 나 사이 심연을 건너고 싶은 희망 혹은 날개를 가지기를 소망할 수 있다. 날개는 결국 심연 속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고, 사람 사이의 심연을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태도도 위험하다. 하지만 불가능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는 가치 있는 일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통하고 싶고 가닿고 싶은 노력이나 태도일 것이기에, 정신분석적 태도는 귀하고 귀한 것이다. 정신분석에 입문하지 않았다면, 꿈에서 눈코입 없는 여학생을 만나지 않았다면, 같은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다시 듣는 경험이 없었다면, 너와 나 사이 심연 속에서 추락해버린 말들을 발견하는 일이 이토록 안타깝진 않았을 것이다. 말해지지 않는 것을 경청하면서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분석적 태도는 너와 나 사이 심연을 건너가는 신비한 날개 경험을 하고자 애쓰는 작가 김연수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소통불가능성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점이 서로 닮았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말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이 소설가의 일이자 정신분석의 일이다. 심연 속에서 죽어간 말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